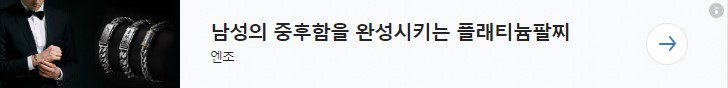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새로울 것이 없는 결론이다.
오히려 너무 늦게 도착한 상식에 가깝다.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데까지 왜 이토록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사법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고는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정상적인 재판, 정상적인 판단이 이제야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전직 총리’, ‘국가 원로’라는 이름 앞에서 법 집행을 스스로 낮춰왔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권력형 범죄와 헌정 질서의 훼손이었다.
이번 판결이 갖는 핵심은 형량의 숫자가 아니다.
내란과 국가 질서 파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해석이나 감정적 관용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있다.
내란은 사과로 덮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눈감아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에 대해 ‘영서’라는 단어가 끼어들 틈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 수차례 “국가 안정을 위해”,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라는 명분 아래 책임을 흐려왔다.
그 선택의 끝은 늘 더 큰 혼란이었다.
이번 판결은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사법의 경고다.
권력을 이용해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면 그 지위가 무엇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것이 무너지면 법치는 구호에 불과해진다.
사법부 역시 이번 판결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일관된 기준과 흔들림 없는 판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선고는 또 하나의 ‘예외적 사건’으로 소비될 뿐이다.
법은 늦게 도착했지만 원칙만큼은 분명했다.
내란에는 타협도 예외도 없다는 것.
이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사법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