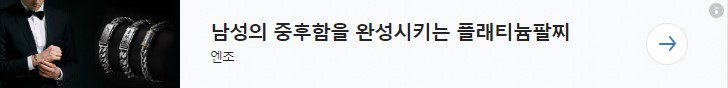가을 숲은 화려하지 않다. 나뭇잎은 천천히 색을 지우고, 빛은 짧아진다. 그러나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는 그 쇠퇴의 시간을 누구보다 찬란하게 그려낸 화가였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황금빛 장식과 여성 누드로 기억되지만, 1900년대 초 그의 시선은 갑작스레 자연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나온 작품이 바로 1902년의 ‘너도밤나무 숲(Beech Grove)’이다.
이 작품은 클림트의 풍경화가 단순한 독립된 시도가 아니라, 그의 예술적 정체성이 확장되는 중요한 지점임을 보여준다. 그는 매년 여름 오스트리아 아터제(Attersee) 호숫가에서 머물렀고, 이곳에서 자연과 조우하며 수많은 풍경화를 탄생시켰다. 특히 너도밤나무 숲은 그의 풍경 시리즈 가운데 가장 실험적이고, 색채적 에너지가 농도 짙게 담긴 작품으로 꼽힌다.
그림 속 너도밤나무들은 화면 가득 촘촘히 서 있다. 트렁크는 가늘고 길게 뻗어 있으며 하늘도 땅도 간신히 숨만 틈틈이 비춘다. 관객의 시선은 숲 사이로 깊게 파고들며, 시야가 멈추는 그곳에 가을 낙엽이 쌓인 부드러운 붉은빛 땅이 펼쳐진다. 클림트는 원근을 거의 지우고 수직 화면에 나무들을 패턴처럼 반복시켰다. 이로써 공간은 실제 숲이 아닌, 숲을 기억 속에서 재구성한 듯한 몽환적 질감을 갖는다.
클림트의 풍경은 그가 이끌었던 빈 분리파(Secession)의 정신과도 닿아 있다. 당시 그는 장식과 상징, 그리고 평면성을 추구하며 새로운 예술의 길을 모색했다. 생명과 죽음,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질서는 그의 예술적 관심을 정확하게 자극했고, 그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암시하는 시적 장면을 화면 속에 담았다. ‘너도밤나무 숲’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지만, 빛의 미세한 떨림과 나무의 질감 속에서 삶의 순환을 속삭인다.
이 작품은 또한 클림트가 황금 시대라 불리는 시기(1900~1909) 직전에 그린 풍경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금박이 쏟아지는 화려한 누드 작품만이 클림트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그림은 그의 다른 면모를 조용히 증언한다. 인간의 욕망과 신화에 집중한 도시적 감각과는 달리, 자연을 향한 클림트의 시선은 더욱 절제되어 있다. 그러나 절제 속에서도 패턴과 색채는 강렬하다. 그에게 자연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장식적 세계였다.
1902년 전시 당시 관객들은 이 작품을 새로운 시각 언어의 출현으로 주목했다. 사실적인 묘사가 거의 사라졌고, 구성은 음악적 리듬을 띠었으며, 색채는 감정의 울림을 전했다. 특히 밑으로 가라앉는 붉은 낙엽과 위로 수직 상승하는 나무 기둥들은, 땅과 하늘을 잇는 조용한 기도처럼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너도밤나무 숲’은 가을의 풍경을 그렸지만, 그 안에는 계절을 넘어선 감정의 시간도 함께 흐른다.
가을은 스스로 사라지는 법을 아는 계절이다. 클림트는 그 사라지는 순간을 화려하게 포착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보다 더 느리게, 더 깊게, 더 아름답게 붙잡았다. 곧 다가올 겨울의 기척이 숲을 감싸도, 그림 속 나무들은 여전히 빛을 머금는다.
달라진 온도와 길어진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가끔, 선명한 풍경보다 흐릿한 기억에 더 큰 위안을 느낀다. ‘너도밤나무 숲’은 그런 위로를 건네는 그림이다. 조용히 바라보다 보면, 조금 일찍 지나가 버린 가을이 다시 한 번 우리 곁에 머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