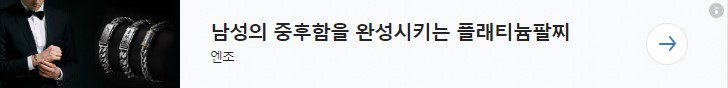날이 차가워지면 식탁이 달라진다. 뜨끈한 국과 조림이 늘고, 생선도 기름기 있는 쪽으로 손이 간다. 삼치는 겨울에 특히 자주 선택되는 생선이다. 굽기만 해도 살이 촉촉하고, 조림으로 만들면 밥이 잘 넘어간다.
삼치는 한국 연안에서 비교적 널리 잡히는 바닷물고기다. 몸은 길고 납작하며 은빛 바탕이 특징이다. 살은 단단하지만 열을 가하면 결이 잘 풀린다. 기름이 고르게 퍼져 있어 익히면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다.
겨울에 삼치가 잘 어울리는 건 조리 방식 때문이다. 겨울 밥상은 국물과 양념의 비중이 커진다. 삼치는 구이로도 좋지만, 무를 넣은 조림에서 존재감이 크다. 무는 양념을 흡수하고, 생선의 풍미를 받쳐 준다. 한국의 겨울 밥상이 ‘생선+무’를 자주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치구이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도 맛이 난다. 굵은 소금으로 가볍게 간을 하고, 중약불로 천천히 익히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진다. 프라이팬 조리라면 수분을 먼저 닦는 것이 중요하다.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면 비린내가 줄고 껍질도 더 잘 익는다.
삼치조림은 겨울 반찬의 대표 격이다.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에 고춧가루, 대파, 마늘을 더하고 무와 함께 졸인다. 생선살은 양념을 머금으면서도 쉽게 부서지므로, 뒤집는 횟수를 줄이면 모양이 깔끔하게 남는다. 국물이 자작해질수록 밥과의 궁합이 좋아진다.
지역에 따라 삼치를 다루는 방식도 달랐다. 해안 지역에서는 잡히는 즉시 구워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손질한 생선을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 두었다가 찜이나 조림으로 쓰는 방식도 있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저장이 곧 식생활의 기술이었다. 겨울을 대비해 생선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요즘은 생물보다 냉동 삼치가 더 흔하다. 그래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분명하다. 해동은 천천히 하는 편이 식감이 덜 무너진다. 조리 직전에는 수분을 닦고, 소금간은 과하지 않게 한다. 레몬즙이나 무즙을 곁들이면 풍미가 정돈된다.
삼치는 특별한 재료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겨울 밥상에서 반복되는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다. 굽기 쉽고, 조림으로도 든든하며, 한 번 해두면 반찬이 오래 간다.
겨울에 삼치를 찾게 되는 이유는 결국 생활의 리듬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삼치 한 점을 굽는 일은, 겨울 식탁을 채우는 가장 익숙한 방식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