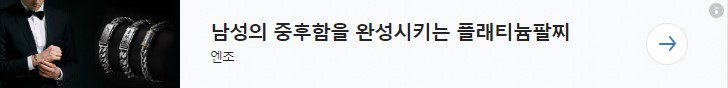모차르트의 레퀴엠(K.626)을 듣는다는 것은 한 작곡가의 마지막 숨결과 마주하는 일이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미완으로 남았기 때문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악보를 붙잡았던 그의 급박한 손놀림, 그리고 남겨진 빈 여백을 둘러싼 수많은 진실과 오해가 음악에 독특한 긴장감을 부여한다. 격정과 침잠이 교차하는 이 작품은 한 사람이 생의 끝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그 깊은 어둠과 빛을 동시에 품고 있다.
레퀴엠의 시작인 인트로이트스는 모차르트의 다른 종교음악과 달리 기묘하게 차갑다. 현악기의 낮은 울림과 합창의 균일한 흐름은 마치 문이 하나 열리는 순간처럼 느껴진다. 이어지는 디에스 이레는 작품 전체의 가장 폭발적인 장면이다. 긴박하게 몰아치는 리듬, 합창의 수직적 구조, 금관의 거친 질감은 ‘최후의 날’을 묘사한다기보다 오히려 생을 붙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에 가깝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라크리모사는 전혀 다른 시간대의 음악처럼 등장한다. 겨우 몇 마디만 남긴 채 모차르트의 손이 멈춘 부분이라는 사실은 이 짧은 선율에 더 큰 비밀을 부여한다. 슬픔이 아니라 체념, 체념이 아니라 조용한 이별에 가까운 울림. 레퀴엠의 ‘진짜 중심’은 바로 이 짧고 고요한 순간에 있다.
이 작품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건 그를 둘러싼 전설들이다. 검은 망토를 입은 사신이 나타나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의뢰했다는 이야기, 모차르트가 그 순간부터 이 작품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곡이 될 것이라고 예감했다는 기록. 사실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레퀴엠을 들을 때마다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유는 음악 자체가 이미 그런 분위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차갑고, 명확하고, 지나치게 솔직한 정서. 마치 죽음이라는 소재를 남의 일처럼 묘사하는 대신, 한 인간이 직접 마주한 감정의 온도를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하다.
레퀴엠은 모차르트 사후 제자 쥐스마이어가 완성했다. 당대 관습과 모차르트의 스케치를 근거로 한 복원 과정은 지금도 음악학계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어디까지가 모차르트이고, 어디서부터가 쥐스마이어인가. 연주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어떤 지점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작품의 생명력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마치 열린 상태로 남아 있는 작품처럼, 듣는 이마다 다른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
후대 연주자들은 이 미완의 작품에 각자의 해석을 덧붙였다. 아르농쿠르의 고음악적 투명함, 카라얀의 장중한 균형, 가디너의 날렵한 텍스처는 각각의 시대 감각을 반영한다. 흥미로운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죽음’이라는 주제가 여전히 현재의 감각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현대의 청중은 레퀴엠에서 종교적 위엄보다 개인적 고독을 더 강하게 읽어내는 경우가 많다.
모차르트 레퀴엠은 미사곡이고 동시에 유서다. 그러나 가장 강렬한 점은 이 곡이 죽음의 끝을 향한 음악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이해하려는 몸부림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불안과 평온, 두려움과 수용이 교차하는 거대한 감정의 지층이 곡 전체에 걸쳐 이어진다. 그래서 이 작품을 들은 후의 감정은 묘하게 모순적이다.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오히려 중심이 잡힌다. 이 음악이 여전히 살아 있는 이유는, 모차르트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에 대해, 삶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솔직했기 때문이다.